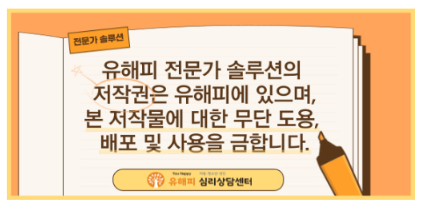YOU HAPPY
유해피 커뮤니티
전문가솔루션
내 아이의 숨은 마음 찾기 2 - 대화 시 주의할 점
내 아이의 숨은 마음 찾기 2 - 대화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유해피심리상담센터 광주광역시센터 전진숙 상담사입니다 :-)
오늘은 ‘내 아이의 숨은 마음 찾기 - 대화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내 아이의 숨은 마음을 찾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화는 취조가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관찰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아이를 돕기 위한 거지
아이를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대화를 원치 않으면,
아이도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으니,
침범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아이에게 엄마가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언제든 도와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만으로도 됐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할지 안 할지는
아이가 결정하도록 두세요.
엄마의 조바심이 아이를 더
행동 뒤로 숨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긴 대화의 예시를 볼까요?
[ 대화 예시1 ]
엄마 : 엄마가 너를 관찰해보니
학교 가기 전날 밤에는 꼭 자는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00이에게 학교는 어떤 곳일까가 궁금해졌어.
00이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야?
아이 : 몰라. 그냥 학교지.
엄마 : 그렇구나.
그런데 왜 학교 가기 전날에는
00이가 잠을 안 자려고 할까?
아이 :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엄마가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면서 깨우잖아.
엄마 : 아~ 엄마가 소리 지르면서
깨우는 게 싫었던 거구나.
그럼 어떻게 깨우면 좋겠어?

[ 대화 예시2 ]
엄마 : 엄마가 널 쭉 지켜보니
학습지 풀 때는 유독 더 손톱을 뜯더라.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는 안 뜯다가
쉬운 문제에는 뜯더라고.
너는 알고 있었니? 왜 그럴까?”
아이 : 어?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몰랐는데.
엄마 : 응. 그랬어. 어려운 문제에는 안 뜯고 푸는데,
산수 계산에서는 뜯으면서 풀더라고.
아이 : 흠....
엄마 : 흠.... 어려운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
간단한 계산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금방 풀 수 있고,
너무 쉬운 거라서 지루해서 그런가?
아이 : 그런가? 쉬운 문제를 풀 때는
‘다 아는 건데 내가 이걸 왜 하지?’하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 대화 예시3 ]
엄마 : 엄마가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걸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데도
00이는 엄마랑 연락이 안되면
계속 전화를 하잖아.
엄마가 지켜보니,
학교 끝날 때만 그러는 것 같아.
학원 끝나고는 안 그러거든. 왜 그럴까?
아이 :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면 싫어.
엄마 : 엄마가 회사에서 바쁘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00이가 전화했는데 못 받았으면
엄마가 다시 전화할 텐데도 싫어?
아이 : 싫어. 엄마는 맨날 전화 안 받잖아.
엄마 : 그렇지, 엄마 목소리 듣고 싶은데,
못 들으면 싫을 것 같아.
그런데, 학원에서 끝날 때는 전화 안 하고
학교에서 끝날 때만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끝날 때랑 학원에서 끝날 때랑 뭐가 달라?
아이 : 학교에서 끝나면 혼자서 걸어서
학원 가야 하는데, 학원에서 끝나면
친구랑 같이 엄마 올 때까지 놀이터에서 놀 수 있잖아.
엄마 : 아~ 학교에서 끝나면
혼자 학원 가는 게 심심한 거구나.
[ 대화 예시3 ]
엄마 : 00이 표정을 보니 뭔가 불편한 게 있나 보네.
엄마가 우리 00이 표정을 잘 알잖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아이 : (퉁명스럽게) 아니요.
엄마 : 그래,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라도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꼭 이야기하렴.
아이 : ......
엄마 :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그럴 수 있지. 엄마도 그럴 때 있거든.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엄마 방으로 와. 기다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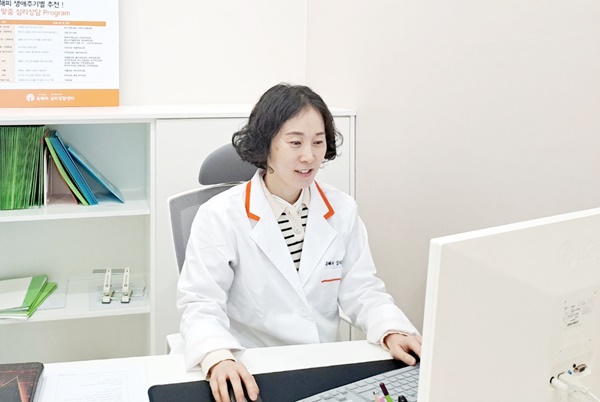
아기들은 모호한 상황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양육자를 바라봅니다.
양육자의 정서를 자신의 행동의 길잡이로 삼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상을 '사회적 참조'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적 이러한 사회적 참조를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아이의 문제에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이를 더 뒤로 숨게 만듭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의연하게 대처하면
아이도 문제를 차분히 바라봅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불안한 아이가 됩니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거면 됐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부모를 자신의 세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